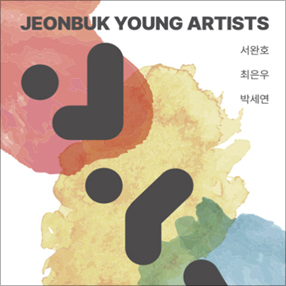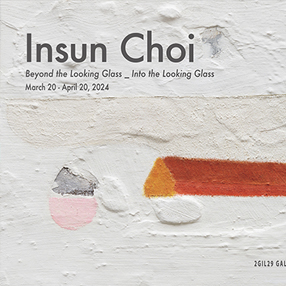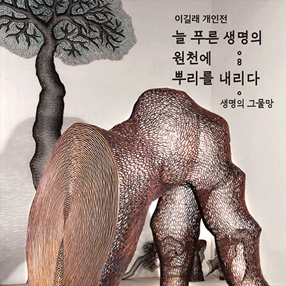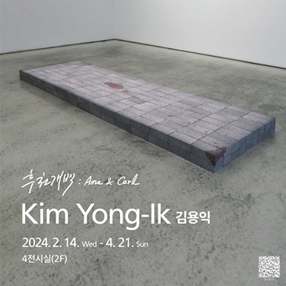본문
-
권병렬
천지의 장구한 기운 90x240cm, 2010
-
박대성
고미2(古美) 종이에 수묵담채, 92x73cm, 2009
-
권병렬
천고기청(天古氣晴) 68x134cm, 2010
-
하반영
꽃게 캔버스에 유채, 37.9x45.5cm, 1970
-
하반영
누드1992 캔버스에 유채, 33.4x53cm, 1992
-
하반영
파리에서, 갈대 캔버스에 유채, 91x116.8cm, 1981
-
박대성
청음 종이에 수묵담채, 216x159cm, 2008
-
박대성
백운 종이에 수묵담채, 130x98cm, 2010
-
Press Release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전시로 2011년 신년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전라북도 미술의 형성과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원로 작가 하반영, 권병렬 화백의 작품과, 경주에서 활동하며 독특한 필치로 수묵화의 새 길을 연 박대성 화백을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망백(望百)의 세월동안 화가로서 한 길을 걸어온 하반영 선생님은 끊임없는 도전과 작품으로 우리의 한 시대를 다양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선비 정신의 운필과 용묵을 강조하고 있는 청곡 권병렬 선생님은 탄탄한 전통의 기반 위에서 수묵화 작업을 펼쳐내려 합니다. 추사를 비롯한 유배지 미술의 찬란한 우리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소산 박대성 선생님은 그렇게 스스로 택한 경주에서의 작업 중에 견고한 수묵의 세계를 열어 보이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창작의 고통이 있는 예술가의 길을, 앞서서 개척해 나가기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예술 사랑의 외길을 가는 원로 작가와 초대 작가의 전시가, 우리지역 미술발전을 위해 살아온 수많은 작가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 길을 가고픈 이들에게 희망과 활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민들께도 소중한 문화향유의 기회가 될 이 전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흥재(전북도립미술관장)
선비 정신의 운필과 용묵
최형순(전북도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오늘의 문인화 정신
청곡의 화면은 그야말로 동양적이다. 서양화처럼 화면 완결성에 크게 개의치 않은 모습이다. <천지의 장구한 기운(2010)>에는 소나무들만 늘어서 있다. 천지도 없으며, 산도 능선도 바위도 찾을 수 없다. 산의 능선대신 소나무들이 늘어서서 만들어낸 선 위로 떠오르는 해가 걸려있을 뿐이다. 소나무 기둥 아래 부분도 모두 사라진 채다. 안개 위에 떠있는 정경처럼 화면 전체를 채우려는 의지가 없다. 작가의 이에 대한 예술철학은 분명하다. <전북문학>에 연재한 화론에서 작가는 그림의 여백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백으로써 먹을 감당케 한다(計白當墨).” 그리고 “허로써 실을 얻는다(計虛當實).”는 것이다. 동양의 그림과 정신은 일찍이 이런 화면 경영을 강조해왔다. 옛 시에서 이르듯, “물고기만 그리고 물을 그리지 않았으나, 그 속엔 물결이 일고 있다(只畵魚不畵水 此畵中有水派).”는 그림. 청곡의 그림에는 그 예술철학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소나무로 그린 천지’는 화면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이 가득한 그런 그림이 아닌 것이다.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사색의 정신이 사유의 결과로 남아있는 화면, 동양의 문인화 정신은 그렇게 청곡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청곡 권병렬은 전주에서 나고 자랐으며, 일본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였다. 전주를 중심으로 후학들을 가르쳤고, 지역 미술과 예술계의 중심인물로 활동해 왔다. 그는 스스로 ‘선비정신으로 빚은 운필과 용묵’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 예술철학에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답습이 아닌가 하는 혐의의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그렇다. 그런데 사실 그런 시각에는 과거의 극복을, 과거를 버려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있다. 오히려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청곡의 문인화정신은 바로 그 점에 기초한다. 10년 대나무를 그려서 내가 변하고, 또 십년을 그려 그림과 내가 다 변하고, 또 십년을 그려 비로소 진정한 대나무 그림을 얻으려 했다는 석도(石濤)의 화론은 여전히 중한 가르침인 것이다. 그 위에서 창작과 새로운 예술세계는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의 현대적 수용
이런 청곡의 화풍을 좀 더 살펴보면, 우선 충분히 두터운 먹 선을 만나게 된다. 그건 그냥 선이 아니다. 때로 먹의 농담으로 때로는 먹 선과 갈필로 다르게 그어지며 제각각의 역할로 바위의 준(峻)이 되는 것들이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적묵과 엷은 담묵이 어우러진 결과는 강한 먹의 효과를 드러낸다. 어렴풋이 먹의 번짐이 절로 만들어내는 자연의 이미지 같은 것은 없다. 예를 들면 유화 물감을 두텁게 하며 붓을 찍었다 떼기를 반복하면 모래알 같은 표면 질감이 나올 수 있다. 그 오돌토돌한 표면은 스스로가 빛을 받아 명암과 그림자를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작가가 하나하나 통제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래로 덮인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청곡이 힘써 만들려는 화면에서 그런 효과에 기대려는 태도를 찾아내기는 어렵다. 수없는 수련으로 연마한 필선들의 운용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이 있을 뿐인 것이다. 그 또한 먹의 농담과 운필에 모든 기운을 담으려는 동양의 정신인 것이다. 그렇다고 화면 전체가 차 있는 그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설청탈속(雪晴脫俗, 2010)>은 화면 모든 부분에 산과 들이 가득하다. 눈 속의 맑음이 탈속의 세계를 담고 있는 듯한 화면에서 어떤 부분에 무엇이 있는지 명백하지 않은 곳은 없다. 멀리 엷은 먹이 드리워진 잿빛 하늘이 가득하고 그 아래 멀리 있는 눈 덮인 산과 능선에 먹 선으로 찍힌 나무들, 그 앞 가까운 곳에 눈의 명암이 만들어낸 산의 굴곡, 계곡 속에 외로이 위치한 눈 덮인 산가의 지붕과 우거진 나무들. 그렇게 모두 풍경 하나하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작품은 서양화처럼 꽉 찬 화면이어서 지금까지의 작가에게서 이질적이기만 한 것일까. 아니다. 따져보면 이 작품 역시 화면에 먹이 번져 있는 면적은 겨우 반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그저 흰 눈이 쌓인 곳으로 여백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동양적 화풍의 성격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셈이다. <천고기청(天高氣晴, 2010)>은 이런 청곡의 작풍으로 특별히 기억되어야 할 작품이라 꼽고 싶다. 하늘이 높다지만 가득한 단풍 위에는 수려한 준봉들이 하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바위산에도 단풍이 한창인 모양이다. 그 단풍은 엷게 붉은 색을 아주 살짝 머금고 있다. 그만한 색으로 그 모든 산의 붉음이 드러난다는 것이 신기해 보인다. 가운데 하늘로 솟구친 나무들이 낙엽을 반쯤 떨어뜨리고 가지를 드러낸 풍경 앞으로 외로운 산가와 어우러져 있다. 단풍이 짙다. 특히 갈필과 먹으로 음영을 낸 검은 그림자 위로 드러난 색이어서 그 가을은 더한층 붉음으로 가득해 보인다. 몇 점의 붉음과 보이지 않을 듯 덮인 붉음이 가득한 가을을 만들고, 한쪽에 국한된 붓길과 강한 먹색이 더없이 높고 맑은 하늘과 공기로 가득한 계절을 수놓고 있는 것이다. 강약이 어우러져 내는 맑은 효과가 돋보인다. 사계절을 산수로 담고 있는 팔곡병풍에는 이런 청곡의 예술세계가 가장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담채가 내는 색의 다양함과 가득한 운필의 맛과 먹빛의 농담이 그리고 있는 풍경들이다. 계절별로, 풍경별로, 그리고 화폭마다 시시각각으로 산수를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신라정신을 현대화한 수묵의 달인
윤범모(미술평론가, 경원대학교 교수)
소산 박대성(小山 朴大成)의 예술세계를 일별하려면 2006년 가나아트에서 발간한 <소산 박대성>(2006) 화집을 보면 된다. 회갑을 맞아 두툼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화집은 소산 예술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화집 속에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다. 바로 작가 약력을 소개한 부분이다. 그곳에는 1974년 타이완부터 2006년 서울 가나아트센터까지의 개인전과 주요 단체전의 내역, 중앙미술대전 대상 수상(1979)과 문신미술상(2006) 같은 수상 기록, 공모전 심사, 작품 소장처 등이 소개돼 있다. 여기까지는 다른 미술가들의 이력 소개와 다름이 없다. 문제는 학력란이다.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1988 윤범모와 중국 화문기행/ 1998 윤범모와 북한 화문기행.’ 단 두 줄의 경력. 그것은 중국과 북한 여행, 하지만 동행자 이름까지 명기하며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 거기에 이름이 오른 여행의 동반자인 필자는 당황스럽기만 했다. 소산과 필자는 많은 지역을 함께 다녔다. 우리는 서울올림픽 개막 직전 이른바 ‘竹(죽)의 장막’이라던 ‘중공(中共)’ 여행을 했다. 외국인 출입금지 구역이 적지 않았던 시절, 우리는 3개월간 중국대륙에서 좌충우돌 ‘화문(畵文) 기행’을 했다. 후일 우리는 북녘 땅도 함께 여행하면서 평양이나 묘향산 등지를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다. 당시의 화문기행은 신문연재로 이어졌다. 필자는 이때의 기록을 풍물사진집 <중국대륙의 숨결>과 <평양미술기행>으로 남겼다. 소산과 필자가 여행한 곳은 주로 히말라야 골짜기나 타클라마칸 사막과 같은 오지였다. 만년설(萬年雪)에 덮인 고산(高山)지대나 오아시스의 고마움을 체득하게 하는 사막을 무작정 헤매 보는 일, 그것처럼 훌륭한 인생 공부가 또 어디에 있을까. 실크로드 답사를 통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공부를 했다. 고행(苦行), 그렇다. 고행처럼 창작의 깊이와 넓이를 실감나게 하는 교실도 많지 않으리라.
자발적 유배
소산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다. 자신의 팔 한쪽까지 잃었다. 자수성가(自手成家)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는 외로운 고행 길을 통하여 나름 세계를 구축했다. 예술은 고행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란다. 작가의 고통이 클수록, 또 그 고통을 잘 소화하면 할수록 예술은 싱싱해진다. 소산의 예술은 바로 극한상황을 넘고 피어난 야생화와 같다. 그 꽃은 바람과 천둥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향기가 은은하면서도 오래간다. 소산과 중국 계림(桂林)을 여행했을 때의 일이다. 계림의 산수 앞에서 소산은 화폭을 펼쳤다. 그가 그림을 그리는 사이에 필자는 티베트를 다녀오기로 했다. 계림은 중국 산수화(山水畵)의 고향이 아니던가. 나는 소산에게 리커란(李可染)의 계림산수 같은 걸작을 만들라고 덕담을 건넸다. 우리는 베이징(北京)에 있는 리커란의 자택을 방문해 타계(他界) 직전의 노(老)대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13억 중국인 가운데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던 20세기의 마지막 대가, 리커란은 소산의 화첩을 보고 남다른 관심을 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리커란의 주특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계림산수였다. 계림에 소산을 남겨놓고 필자는 티베트로 향했다.
1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계림으로 돌아오니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고생만 잔뜩 했다”는 것이다. 아니, 그림 그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왜? 한마디로 그는 계림을 그리지 못했다. 무수한 스케치들만 마치 사투(死鬪)의 흔적처럼 쌓여 있었다. 중국 산수화의 고향을 정복하겠다는 욕심은 결국 과욕(過欲)임을 자인하는 것 같았다. 문제는 계림 절경이 한국의 자연과 달리 지나칠 정도로 이색적 풍경이라는 데 있었다. 이는 마치 북송(北宋)의 화가 곽희(郭熙)가 그의 <임천고치(林泉高致)>에서 말한 가행자(可行者)가 아닌 가거자(可居者)의 태도를 연상시킨다. 때때로 자연은 관광객처럼 대충 보고 화면에 옮기려 할 때 허락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물론 껍데기만 흉내 내고자 할 때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형상화하려면 일정기간의 소화 작용이 필요하다. 자연과 함께 살면서 자연과 합일될 때, 비로소 창작의 문은 열린다. 절경, 아니 자연은 반추(反芻)의 시간을 요구한다. 소산은 현장에서 화폭을 펼치는 화가다.
하지만 대상이 소화되지 않으면 화폭을 접는 화가이기도 하다. 그가 경계하는 것은 이른바 관광 산수이기 때문이다. 관광객처럼 겉만 흉내 내는 태도의 그림은 그림이 아니다. 이것이 소산이 주장하는 예술론이다. 현재 소산은 서울의 가족과 떨어져 작품 소재의 현장인 신라의 古都(고도) 경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른바 ‘자발적 유배’의 경우다. 우리 역사에서 유배문화는 종종 찬란한 예술적 성과를 낳기도 했다. 윤선도(尹善道)· 정약용(丁若鏞)· 김정희(金正喜) 등이 그 예이다. 김정희의 대표작 <세한도(歲寒圖)>는 제주 유배시절의 산물이다. 조선 선비의 유배는 타의(他意)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소산의 경우는 ‘자발적’ 유배다. 스스로 선택하여 외롭고 절실한 상황 속에서 작품과 맞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타의의 상황에서 나온 ‘세한’의 의미와 자발적 선택에 의해 나온 ‘신라’의 의미는 차원을 달리한다.
수묵화 전통의 창조적 계승자
소산은 먹 작업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오늘날 미술대에서 먹 작업을 하는 미술학도는 보기 어렵다. 이 같은 풍조는 화단으로도 연결된다. 그렇다면 대답은 단순하다. 추사(秋史) 이래 먹 작업의 정통 계승자는 누구일까. 추사가 주장한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를 가슴에 품으면서 자유자재의 필력(筆力)을 구사하는 수묵(水墨)의 달인, 그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한국미술계가 소산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먹의 정통 계승자’라는 데에서도 찾게 한다. 소산 예술의 주요 특징은 우리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점이다. 그의 출발은 전통적 수묵화의 충실한 학습에서 비롯됐다. 그의 출세작이자 중앙미술대전 대상 수상작품인 <상림(霜林, 1979)>의 경우, 안개 짙은 산간 마을을 사실적 묘사로 경물을 집약한 작품이다. 거대한 산 능선은 흐릿하게 배경으로 처리했고 전경(前景)은 성글게 서 있는 나무들을 중심으로 돌산과 밭이 부각되어 있다.
대상을 압축하면서 담채(淡彩)에 의한 사실적 표현은 경쾌한 화면경영을 보여준다. 상큼한 수채화를 연상시킬 정도로 재래의 수묵화와 차별상을 보인다. 산수의 정신은 살아 있으되, 종래의 정형 산수와는 궤도를 달리한 것이다. 소산은 제주 풍경이라든가 을숙도와 같은 현장을 화면에 즐겨 담았다. 을숙도 연작은 감각적 화면구성으로 이미 전통산수의 세계와 거리를 둔 성과물로 각광받았다. 그는 생략과 집중으로 대상을 자유롭게 재단하고 부각시키면서 이를 소산식(小山式) 풍경으로 각인시켰다. 소산 풍경은 자연이 주종을 이룬다. 그러면서 문화유산의 현장이나 인물들을 출현시킨다. 소산 회화의 특징은 무엇보다 수묵 작업이라는 데 있다. 그는 어쩌면 거의 마지막 세대에 해당하는 수묵화가인지도 모르겠다. 수묵화가 푸대접 받는 현실에서 어느 누가 하도(下圖) 작업에만 10년 이상을 투자하겠는가.
무소의 뿔처럼 가라
최형순(전북도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한 길인가, 어디로도 가능한 길인가?
그저 화업으로만 한 평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불꽃처럼 타올랐던 빈센트 반 고흐로 잘 알려진 이런 화가의 삶을 상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뒤흔드는 예술을 원한다. 감동할 수 없는 삶과 그에서 나오지 않은 예술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을 위해서 집안의 성(姓)까지 버린 화가. 한학으로 시작하여 일본을 유학하고, 강원도의 오지에서부터 화가들에게 가장 열린 곳인 프랑스 파리를 무대로 두루 활동했던 작가. 하반영은 90세가 넘도록 그렇게 자신의 화업을 우리에게 펼쳐왔다. 얼마 전에는 시인인 자부의 환갑에 즈음하여 화시집(畵詩集)을 제안했다. 흔히 아는 시화(詩畵)가 아녀. 그전에, 오지호 선생께서 한하운 시인을 도우려고 화시집을 낸 적이 있어. 그림도 추상이고 시도 추상이었지. 전람회를 열어 그 판매수익을 한하운 선생에게 몽땅 주었어. 화가가 한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어. 그 뒤로 그런 일을 한 화가가 없어. 한하운의 시 <전라도길>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소록도로 찾아가면서 보니께 정말로 전라도는 산도 길도 벌건한 거여. 그 이후로 하반영 화백의 그림과 자부 김용옥 시인의 시로 화시집이 나왔다.
작가의 예술철학이 어떤 예술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오로지 한 길, 예술을 위해 어떤 삶의 번뇌도 기꺼이 치렀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면, 그 예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 또한 다른 감동을 주는 셈이다. 세상의 진리를 꿰뚫고 있는 유일한 작품인양 범접할 수 없게 하는 그림이 아닌 것이다. 예술에 대한 태도나 집안의 내력과 같은 아상(我相)을 기꺼이 버릴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자랑스러운 귀족의 뿌리와 같이 하나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기꺼이 유목할 수 있다는 것은, 한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와 배치되는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소리 내어 읽을 수가 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파타(Sutta_nipata)>가 가르치는 대로 묵묵히 흔들림이 없는 것. 이 시대에 그런 원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일관성인가, 자유로움인가?
매너리즘이 처음 ‘위대한 양식’인 그랑 매너(grande manner)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풍, 미켈란젤로 풍을 우리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레오나르도가 치밀한 과학과 사실에 기초하여 변형 없이 유려한 형상을 잡아가는 것과, 미켈란젤로가 불끈거리는 근육처럼 필요한 부분을 부각하는 화법은 분명히 다르다. 그렇다고 레오나르도가 사실적이고 미켈란젤로의 사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면서도 각자의 스타일을 충분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처럼 작가의 스타일은 하나의 양식(매너)으로그림 파리에서, 갈대 중요한 일이다. 다만 그것이 스스로의 창조성을 죽이며 답습될 때를 염려하는 것이 매너리즘을 나쁜 뜻으로 사용하는 문맥일 것이다. 하반영의 작품이 그런 면에서는 하나로 일관된 양식이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특히 일생의 중요한 모든 작품들을 모아놓고 볼 때의 작품 경향이 그렇다. 치밀한 사실적 작품에서부터 인상파적 풍경, 초현실의 의미를 품고 있는 형상들, 화면분할과 과감한 데포르마숑(형체 변형)을 가한 누드, 그리고 추상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수많은 작가들의 자기복제와는 확연히 다른 작풍(作風)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 고금 평원처럼 펼쳐진 야트막한 먼 산 뒤로 구름을 머금은 높고 평평한 산, 그 앞에 거대한 광활하게 펼쳐진 갈대숲이 나오는 작품 <파리에서, 갈대(1981)>는 이국적이다. 한국의 풍경화로 떠올릴 수 있는 그림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제목에서는 갈대밭이 주제일 듯하지만 그림에서는 작은 물길과 그 물길에 깊은 그림자를 던지며 솟아오른 바위 덩어리들이 더 크게 부각되어 있다.
<눈 덮인 곰티재(1975)>나 <낙동강 하류풍경(1960)> 역시 여느 인상파풍의 한국 풍경화와는 다르다. 화가의 붓자국을 드러나지 않게 그린 화면 각각은 부드러운 자연의 사실성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림 소 똑같은 필법으로 그렸지만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들은 주로 정물화들이다. 가지런한 나무 선반과 고풍의 천을 깔고 잎 넓은 그릇과 앵두를 놓은 <고금(2009)>은 옛 향취를 물씬 풍긴다. <조상의 얼(1977)>에서도 고졸한 정물과 그 위에 녹물 자국이나 새끼줄 같은 소재들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정물과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경우다. 단단한 흙에 균열을 내며 나오고 있는 새싹이 있는 <어머니의 힘(2008)>에서는 초현실의 느낌이 한층 짙게 배어나온다.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충실한 사실성으로 자신의 필치를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번에 출품되는 그림들에는 인상파적 화풍도 적지 않다.
일본을 통해 수입한 미술교육을 받은 작가로서 이런 화풍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대다수의 작품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일부라는 것이 오히려 특이하다고 해야 할 일이다. 일제를 통과하면서 토속적인 한국적 풍경화는 모든 작가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작품 양식으로 보자면 <이리에서, 평화 염원(1992)>은 굵고 검은 테두리로 형상을 잡고 원색적인 거친 터치를 통해 심한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 목가적인 형상이 주제와 어울리는 것이지만 형식은 생략과 변형으로 충실한 형상표현과는 아주 다르게 되어 있다. 작가의 많은 작품들이 또한 이런 표현 방법을 담고 있다. <소(1987)> 역시 웅크린 자세로 머리를 아래로 한 채 그림 가운데 가득하며 그 형상은 심한 데포르마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전시제목2011 신년기획전
전시기간2010.12.31(금) - 2011.02.06(일)
참여작가 권병렬, 박대성, 하반영
관람시간10:00am - 06:00pm
휴관일월요일
장르회화
관람료무료
장소전북도립미술관 Jeonbuk Art Museum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 )
연락처063-280-4354
-
Artists in This Show
-
1925년 출생
-
1945년 경상북도 청도출생
-
1922년 경상북도 김천출생
-
전북도립미술관(Jeonbuk Art Museum) Shows on Mu:umView All
Current Shows
-
권현빈: We Go
두산갤러리
2024.03.20 ~ 2024.04.20
-
함(咸): Sentient Beings
갤러리 학고재
2024.03.13 ~ 2024.04.20
-
최인선: 거울 너머로_거울 속으로
이길이구 갤러리
2024.03.23 ~ 2024.04.20
-
이길래: 늘 푸른 생명의 원천에 뿌리를 내리다 - 생명의 그물망
사비나미술관
2024.01.25 ~ 2024.04.21
-
2024 기억공작소Ⅰ 김용익展 후천개벽: 아나와 칼(Ana & Carl)
봉산문화회관
2024.02.14 ~ 2024.04.21
-
김연옥 기획초대전: 비밀의 정원(The Secret Garden)
쉐마미술관
2024.03.15 ~ 2024.04.21
-
김용익: 아련하고 희미한 유토피아
국제갤러리
2024.03.15 ~ 2024.04.21
-
장현주: 어둠이 꽃이 되는 시간
갤러리 담
2024.04.12 ~ 2024.04.24